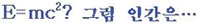사월 外 2편 / 이혜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01 20:08 조회5,378회관련링크
본문
사월
차가운 맨손을 비비면 사월이 구겨지는 소리가 난다.
그때 모란이 핀다.
구겨진 편지처럼 피어나는 모란,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
동그랗게 뭉쳐져 바닥으로 던져진 많은 사월이 그 속에 담겨있다.
내일의 날짜들처럼 벌들이 윙윙거리는 사월의 만개, 불을 땐 듯 붉은 꽃송이들, 사월의 아랫목인양 냉방에서 쫓겨난 화씨인양 겹겹이 껴입은
고민인 듯 물결인 듯 바람이 미끄럽게 지나간다.
맨손을 비빌 때마다 섣불리 구겨버린 시간들이
아득한 신기루 하나씩 꽃술로 품고 있다.
주변을 맴돌며 속으로 삼켜버린 이름이며 추신 같은 글자들 위로 또 모란이 핀다. 깊어진 햇살 쪽으로 귀 기울이는 동안 눈꼬리만 겹겹이 늙었다. 모란이 피는 주변을 갖고 있다면 그건, 내 주위를 서성거렸던 어떤 이름이 있었다는 것.
사월이 묵고 또 묵으면 모란 대 같이 늙어서
한 송이 구겨지는 사월만 애가 탄다.
쉬는 날
끝까지 밀린 것들은 다
쉬는 날에 몰려 있다
서로 먼 귀를 갖고 있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간극도
유채꽃 무더기 같이 다글다글 앓는 소리도
이날저날을 기웃거리고 미루어 둔 일들도
모두 쉬는 날들에 모여 있다
흐르는 물살을 건너가는 징검돌의 사이 같은
유실수들의 해거리 같은 그 중간의 쉬는 날
욱신거리는 지병도 묵은 때 낀 구석도
다 풀린 파마머리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까지 와 있다
한때는 중심이었던 일들
그 중심에서 밀려나면 모두
쉬는 날로 몰려간다
줄줄이 묶여 있는 혈연도 쉬는 날이 있어
모른 척, 눈 감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헛된 바람이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갓 겨울을 견딘 것들이 쉬는 날을 기다린다고
날들과 날들의 그 먼 간극 사이에서
발을 구르고 있다고
어눌한 발음들이
수화기 너머 끊어졌다 이어진다
]
두꺼비
소낙비 끝
두꺼비 한 마리 느릿느릿 마당으로 기어든다
집 있는 자식 있고
집 없는 자식 있다
두껍아 두껍아 이 낮은 처마의 헌집 갖고 새집 다오
노부부의 손목 끝에 우두커니 깍지 끼고
앉아있는 두꺼비들
그 느릿한 두꺼비들이 집을 내어주고
그러고도 남은 무주택 자식 하나 고민하는 두꺼비 등짝
한껏 굽은 어깨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매미 소리가 욱신거린다
무슨 걱정이기에 저리 우둘투둘한지
근심을 한 몸에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두꺼비
슬금슬금 장독대 뒤로 몸을 숨긴다
어둑한 구석 잠시 머물 공간이면 족한 그에게
집이란 그저 몸을 가리기 좋은 곳
몇 장의 풀잎과 서늘한 그늘이면 족하다
이집 마당과 마루 밑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등짝에 기와를 얹은 집 몇 채 있다
그중 어떤 집에는 뜨거운 전류가 흐르기도 한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직도 귀에 쟁쟁한 먼 기억의 노랫소리를 따라
느릿느릿 비 개인 텃밭으로 몸을 옮기는 부부
봉숭아꽃 만발한 마당 끝으로
꽃그늘이 붉게 떨어져 있다
이혜순
2010년 시안 등단
시집<곤줄박이 수사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