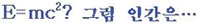김경주/ <김경주의 시적충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3 13:12 조회50,382회관련링크
본문
김경주의 시적충동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농담 - 민화(民畫)
화가(畫家)는 무명(無名)이다. 아비가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그 이름으로 밥을 짓진 못했다. 소작농으로 살아온 몇 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떠돌이 생활이었다. 그림교육을 받은적이 없으나 무명은 그리는 일이 좋았다. 떠돌이 생활중 몇 해 지공(紙工)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다. 종이 원료가 되는 닥나무를 밭에 재배하는 잡령(雜令)을 맡은 관리밑에서 무명은 좋은 종이냄새를 알아보았다. 버려진 젖은 닥종이를 가져와 방바닥 위에 펴서 불을 때어 말렸다. 종이가 다 마르자 무명은 붓을 먹에 적신 후 골짜기를 하나 처음으로 그곳에 그려넣었다. 흰 골짜기! 무명이 태어나서 처음 그린 그림은 흰 골짜기였다. 무명은 거기서 태어났고 어느 마부에게 발견되어 마을로 내려오는 당나귀등에서 이승의 첫 잠을 잤다.
누런 들을 그려나가다가 무명은 새벽에 잠이 깨곤 했다. 변방의 오랑캐가 마을로 들어와 사람들의 머리통을 베어갈 때 그는 그 틈을 타 달아났다. 무명은 산능선에 몸을 숨겼다. 머리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양반도 서민도 깊은 골짜기에 몸을 숨겨야 했다. 며칠을 굶어 무명의 몸은 묽어졌다. 벼들과 풀들에 핏물이 가득 베었던 시절, 무명은 처음으로 난초를 그렸다. 붓은 흰죽처럼 종이위로 흘러내렸다. 피 묻은 풀 포기들이 나타나고 바위가 몇개 그 옆으로 흘러갔다. 먹물로 그린 난초는 검고 창백했다.
십장생 (十長生)
무명의 그림들은 속화라고도 불리었고 어염집의 병풍이나 족자 벽에 붙어있곤 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삶은 스산했다. 귀물들을 그려넣었으나 이름을 지은적이 없으니 알아주는 이도 없었다. 다가올 회갑잔치와 주연에 쓰일 그림을 주문 받으면 뒷방에 앉아 장수를 기리는 산짐승들을 그리곤 했다. 뒤집어진 거북은 액운을 나타난다 하여 그릴수 없었다. 산으로 올라온 거북은 다들 좋아했다. 수십마리 거북이 흰개미들처럼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도 있었다. 소나무들은 푸른 냄새가 나는 것들로 그려넣었다. 산란에 가까운 사슴은 맑은 개울 물을 마시고 학은 깃털이 비리지 않도록 이슬을 털곤 했다. 구름은 물처럼 흰 빛으로 바위를 비추었다. 그림을 내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무명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적에 죽은 몸이 쌓여있었다. 작은 두 발이 뻗어나온 것으로 보아 아직 이른 아이같았다. 문둥병이 옮은 아이가 시퍼런 낫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버렸다고 했다. 무명은 새벽에 지붕위에 있던 학 한 마리가 거적더미위로 내려 앉아 몸을 비비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작호도(鵲虎圖)
산이나 들에서 호랑이를 한번 본 이들은 한동안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호랑이의 기골과 괴함에 공포가 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사람을 물지 않았다. 무명은 호랑이가 내쉬는 들숨과 날숨을 그림속에 그리곤 했다. 본디 작호도는 잡귀의 침범이나 액을 막는 것으로 그리는 그림이었다. 무명은 지공으로 일하던 시절 대숲 근처에서 가을 호랑이를 본 적이 있다. 느긋느긋 숨을 내쉬며 햇볕좋은 곳에서 아랫배를 뒤집고 있는 호랑이였다. 호랑이의 살은 평온하고 따뜻해보였다. 그가 주로 그린 가을 호랑이는 살이 올라 있었다. 산맥같은 숨을 내쉬며 마을을 내려다보는 호랑이의 수염은 가파르고 기세가 좋았다. 사람들은 액운을 막기 위해 무명에게 호랑이 그림을 자주 맡겼다. 사신도(四神圖)로 계승된 적도 없었지만 호랑이그림들은 무명화가들에게 좋은 먹이그림이 되었다. 표정이 다른 호랑이그림들이 넘쳐났다. 호랑이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도 호랑이가 떠돌이 화가들을 먹여살리는 것이었다. 호랑이덕에 가을엔 호랑이에 물려간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어해도(魚蟹圖)
얼어죽은 어린 동승을 업고 마을을 내려온 노스님이 있었다. 어린 스님이 왜 얼어죽었는지는 알수가 없었다. 다만 울면서 어린 스님의 얼어붙은 발가락들을 입으로 녹이는 한 여인이 곁에서 울어주곤 하였다. 그가 어미라는 풍문도 있었고 출가전 노스님의 아이라는 소리도 떠돌았다. 병든 노스님을 위해 혼자 불로초를 따러갔다가 겨울 뱀에 물려죽었다는 소리도 돌았다. 모든 것은 소문일 뿐이었다. 무명도 부인을 두었으면 저 또래의 아이가 하나쯤 있을 법한 나이였다. 여인을 아직 품어 본 적이 없는 무명은 주로 그림을 주문받으면 곁방을 하나 얻어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지내다가 떠나곤 했다. 딱 한번 벙어리 여자아이가 한번 방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자신을 그려달라는 것이었다. 무명은 거절했다. 무명은 산짐승들이나 식물을 주로 그렸을 뿐 사람을 그리진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화가들과 달리 무명은 사람은 그리지 않았다 ‘사람에겐 잡귀가 많아 그림으로 들이지 않소.’ 그말은 무명의 속것이 아니었다. 벙어리 여자아이를 물리치고 그는 흰죽에 남은 물을 종이에 부었다. 먹이 아닌 흰 죽의 희미한 물로 무명은 물 속에 사는 붕어를 그리기 시작했다. 붕어가 물 속에서 옅은 숨을 쉬며 흘러갔다. 물 속 붕어의 숨은 뒷방에 들어가 우는 벙어리 여인의 옅은 울음과 닮아 있었다. 희미한 그 울음소리를 무명은 붕어의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무명은 자신의 붕어들 위로 엎드려 울다가 잠이 들었다. 무명이 그린 물고기들은 사람들에게 흥정이 잘 되지 않았다. 색이 연하고 비리다는 이유였다. 잉어처럼 살이 오르고 붉은 기운이 있는 물고기들을 주로 원했다. 젊은 부부의 방 장식이나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잉어와 아침 해를 함께 섞어 달라는 이들이 많았다. 무명은 젊은 시기엔 송사리, 복어, 게, 새우, 조개, , 붕어등을 모두 그렸지만 나이가 능선을 넘어서면서 부터는 붕어만 그렸다. 무명이 그리는 붕어들은 두 마리 뿐이었다. 어미곁을 따라 오는 어린 붕어. 둘이 붙어 구석에서 지느러미를 비벼대는 암수놈. 무명의 붕어들은 늘 흰 죽의 남은 물로 만들어진 붕어였으므로 투명하고 비렸다. 사람들은 무명의 외모를 두고 물 속에 사는 붕어같다고 했다. 십년 후 그 마을에 다시 무명이 돌아왔을 때 벙어리 여자는 저수지에서 물에 떠 죽은 붕어 한 마리처럼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즈음 무명은 동상으로 손가락이 얼어붙어 약지(藥指) 하나를 잃은 후였다.
산수도(山水圖)
떠돌이 생활에 익숙한 무명은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다. 산 능선과 골짜기와 들과 밭은 무명의 잠자리로 익숙했다. 소문을 듣고 무명에게 산수를 그려달라는 이가 찾아오면 무명은 말없이 붓을 구들에 말리곤 했다. 거친 산과 들을 오래 지나가야할 붓이었다. 산짐승들이나 오동나무, 벌레들과는 달리 산수는 깊을 더해야 완성되곤 하였다. 무명은 병풍으로 쓰일 산수 하나에 곁방 석달을 원했고 한주에 닭 한 마리를 삶아 달라고 했다. ‘ 산하나를 그리려면 내가 먹어야할 게 매화, 동백, 진달래, 개나리, 버드나무등 많아요. 이것들로는 원기가 부족하오.’ 무명은 밭은 기침을 하며 산을 이어나가고 들을 펼쳐 나갔다. 가끔 그곳에 생명들이 자라나 피부가 트기 시작했다. 해와 달을 그려넣으면 빛이 생기기 시작했다. 해와 달이 나타나면 그림은 완성이 되어갔다. 무명은 깊은 곳까지 산짐승들을 데려가기 위해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무명의 수염은 밭처럼 듬성듬성 해져갔다.
‘화조도(花鳥圖)라 하여 민화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가 그것인데 당신은 어찌 의좋게 노니는 한쌍의 새나 화조도라 불리는 것들은 피하오? 사람들은 혼례식이나 대례병때 사용할 원앙이나 공작 제비 참새등을 물이나 바위에 함께 그려 넣기를 원하지 않소?”
“ 젊은 시절엔 그 놈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다 볼줄 알았지만 이제 그 놈들의 눈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 그림에도 벌레들이 끼기 시작한가 봅니다.”
“ 호랑이는 다들 해먹잖소? 자네도 호랑이로 재미좀 보았다 들었는데...”
“ 호랑이를 진짜 잡아 삶아 먹은 놈은 하나도 없습죠.”
“ 해학이 빼어나다는 풍문을 들었는데 흥이 안당기오?”
“ 깊은 굴로 호랑이를 찾아가 한번 보고 오면 표정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무명의 그림은 더 이상 경축일에 사용되지 못할 만큼 어둡고 캄캄해져갔다. 다만 산수는 가능했다. 무명은 눈이 덮인 들에 붓이 얼어붙고, 겨울 구름에 얼어붙은 차가운 새들의 깃털이 좋았다. 무명의 그림은 점점 화려한 색보단 농담이 짙어졌다. 그림 속 산짐승들도 마을을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 한 겨울에도 그림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나타날 뿐이었다. ‘ 의좋게 놀았으니 다행이지...’ 무명은 몇 편의 산수화를 더 남기고 사라졌다. 소문엔 가을호랑이가 데려갔다는 소리도 있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붕어장수가 되어 어전에 장업을 시작했다는 소리도 있었다. 아무도 무명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마지막 산수화를 주문받고 무명은 처음으로 바다로 나가 보았다. 어떤 연유에선지 무명은 오랫동안 산이나 들로만 머물고 바다근처엔 기웃거리지 않았다. 무명은 흰 눈이 내리는 먼 바다를 보다가 돌아왔다. 바다는 벼루 위에 얼어붙은 먹처럼 캄캄해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