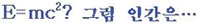아무르 강가에서 / 박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정대 작성일17-12-21 10:11 조회14,435회관련링크
본문
박정대
그대 떠난 강가에서 나 노을처럼 한참을 저물었습니다 초저녁별들이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낮이 밤으로 몸 바꾸는 그 아득한 시간의 경계를 유목민처럼 오래 서성거렸습니다
그리움의 국경 그 허술한 말뚝을 넘어 반성도 없이 민가의 불빛들 또 함부로 일렁이며 돋아나고 발밑으로는 어둠이 조금씩 밀려와 채이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어둠 내 머리 위의 어둠, 내 늑골에 첩첩이 쌓여 있는 어둠 내 몸에 불을 밝혀 스스로 한 그루 촛불나무로 타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대 떠난 강가에서 그렇게 한참을 타오르다 보면 내 안의 돌멩이 하나 뜨겁게 달구어져 끝내는 내가 바라보는 어둠 속에 한 떨기 초저녁별로 피어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초저녁별들이 뜨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야광나무 꽃잎들만 하얗게 돋아나던 이 지상의 저녁 정암사 적멸보궁 같은 한 채의 추억을 간직한 채 나 오래도록 아무르 강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별빛을 향해 걷다가 어느덧 한 떨기 초저녁별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4년 소월시문학상 대상수상작
아무르강은 러시아와 중국, 몽골 등 3개국의 국경을 거치는 강이다. 시와 방랑은 어쩌면 동의어가 아닐까. 시인은 곧 방랑객인 셈이다. 비행기만 타면 세상 어디든지 가는 요즘이다. 시 속에서도 이제 지구의 뒤편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외국여행이 힘들었던 시절, 원로시인들의 세계기행시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센강이 어쩌고, 마천루가 어쩌고 하는 별 감흥도 없는 시들을 읽으면서 ‘이건 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오늘 이땅의 방랑객들은 인도로 가고, 네팔로 가고, 몽골로 간다. 갠지즈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 히말라야에서 킬리만자로까지. 오랜 사유와 번뇌가 뚝뚝 묻어나는 진짜 시들을 쏟아낸다. 시인은 인간세계의 성감대 같은 예민한 존재가 아닐까. 어스름 저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초저녁별 같은 시인들. 〈오광수기자 oks@kyunghyang.com〉
|